소통을 사찰하는 국가
김훈규
결국 저도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남들 다 그것을 들고 다녀도 전부터 지니고 다니던 정들고 손에 익숙한 휴대폰을 절대 바꾸지 않으리라 마음 먹었었거든요.
돌이켜 보면, 십 수년 전에 허리춤에 삐삐를 차고 다닐 때에도, 사람들이 시티폰이니 휴대폰을 비싼 돈 주고 바꾸고 할 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은 그리 오래가지 않더라구요.
주변 사람 100명 중 15명만 들고 다니고 손에서 만지작거리는 장면이 수시로 포착되면, 그 실용성 효용성은 둘째 치고 가지고 싶다, 가져야겠다는 심리가 발동된다고 하더군요. 저 역시도 그런 일반적인 심리에서 항상 자유로울 수 없었던가 봅니다.
시시때때로 손에서 매만져지는 요상한 물건은 카메라, 전화, 컴퓨터 등을 한데 뭉쳐서는 제게 아주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40개월 짜리 딸아이의 더할나위 없는 장난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손가락으로 슥슥 굴리고 문질러가며 사진도 찍고, 만화영화도 보고, 화면 속 동물들과 말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저보다 더 익숙하게 사용법을 터득한 듯 합니다.
요즘 갓난아기들에게도 이 스마트폰이 다른 어떤 장난감보다 친숙한 놀잇감이 되었습니다. 기절할 듯 울어 제끼다가도 엄마가 켜주는 눈앞의 스마트폰으로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나서는 금방 얼굴에 웃음을 찾습니다.
한 손 안에 모든 세상이 들어 있고 그 놀라운 세상은 다른 많은 물건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언젠가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전철을 탔었습니다. 전철을 탄 서울 시민들이 딱 두 분류로 나눠지더군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대부분 2,30대, 간혹 40대 전후로 보이는 분들은 한결같이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화면 속에 빨려들 듯이 열심히 쳐다보고 있거나 화면을 손가락으로 문지르고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연인, 친구와 같이 앉거나 서 있는 일행들도 그들 사이에 대화 겉은 것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착 달라붙은 두 명 또는 그 이상의 일행들은 아마 인터넷을 통해 한바퀴를 돌고 온 전파를 타고 대화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했습니다. 이어폰으로 귀를 막고 화면으로 서로의 시선이 차단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웃고 또는 진지하고 또는 뭔가를 말하듯이 입술을 실룩거리고 있었거던요.
손에 스마트폰을 쥐지 않은 분들은 신문이나 책을 읽기도 하고,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전철 내 광고판을 유심히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창밖을 쳐다보는 분들도 간혹 있구요. 번잡한 서울의 바깥세상과 달리 참 조용한 전철 안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스마트폰을 들지 않은 이들이 훨씬 더 많은데 왜 그들이 더 왜소해 보이고 소외되어 보였을까? 그들의 침묵과 표정이 더 무거워 보이고 불안해 보였을까? 끊임없는 침묵을 요구하고 입과 귀를 통한 소통이 마비된 비정상적인 세상이 결국 정상이 되는 세상을 비춰주는 것은 아닌가? 모든 개인의 사생활과 위치추적마저 통제되지 않는 세계최고의 사찰국가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의 손에 들려진 이 스마트폰은 혹시 저들의 감시기구가 아닐까?
침묵하는 다수는 결국 제 손에 들려지고 말 이 기계를 거부하는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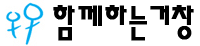







코멘트(Comments)